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중의 청각장애인, 듣지 못하고 수어사회도 속하지 못해 소통에서 소외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법률이 시급합니다.
작성자엄대호
제안일자2025.07.09
조회수135
소수자 중의 소수, 비음성.비수어 청각장애인 소통 보조법 법률안 도입 요청
<도입 취지>
현재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서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서로 낯선 이였을 것이다. 그들이 친해진 계기에는 서로 간의 첫 마디가 있었을 것이다. 첫 마디를 통해 시작하는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이 그 첫마디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나도 그런 첫 마디의 말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른바 뇌 속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먼저 말 걸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입모양을 움직여달라고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낯선 사람에게 처음부터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당연한 소통 방식이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 먼저 말 거는 것은 비장애인에게는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일반 비장애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1인으로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소외될 것을 감수하고 마음을 크게 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냥 모자란 사람 취급이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일생 동안 반복된다. 청각장애인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안 그래도 부정확했던 목소리가 더 작아진다. 그러한 소통을 시도할 때마다 위축된다. 청각장애인은 결국은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된다. 종국엔 청각장애인 아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거의 대부분의 일반(비장애)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도움으로 첫 마디로 시작하는 인간관계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기에 비장애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들 자신도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 내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앞서 말한 첫 마디로 시작하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지능 문제 아니냐 라고 하거나, 또 다른 문제(청각장애인의 적극성 부족, 친해지려는 의지 부족)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온다. 들은 것이 없기에 뇌 속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청각장애인조차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개인의 지능이 부족한 것처럼 취급한다. "청각"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장벽이 됨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청기나 인공와우로도 청력 보정이 잘 안 되는데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있는 사회에서 사는 청각장애인은 극히 드물고, 그나마 있던 드문 사람도 비장애 사회에서는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청각의 문제나 기타(기형 등) 문제 등으로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말 소리를 명확히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낙오자, 패배자 취급을 받아 수어를 배워서 저 언덕 너머로 사라졌거나, 아예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면서도 청각에 장애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 현재 비장애인 사회에서 사는 대부분 청각장애인들의 현실 인식이다. 이는 청각장애인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나의 문제 제기의 본질이 ‘청각 그 자체의 결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이 여태 청각장애인 아무도 청각장애인의 청각 결손에 대해 담론을 제기한 적이 없는 원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 소리를 명확하게 듣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름도 없는 청각장애인을 비음성・비수어 청각장애인이라고 하겠다. 비음성, 비수어 청각장애인이 일반(비장애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입 모양 천천히 보여주기, 말할 때 입을 손으로 가리지 않기, 문자(휴대폰) 등으로 대안 소통 방안 제시가 있다. 하지만 비음성 비수어 청각장애인 본인이 직접 요청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앞서 말한 대부분의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청각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비수어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뭘 더 노력하거나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나는 마침내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법률로 두어 입 모양을 통한 소통, 문자를 사용한 소통을 청각장애인의 기본권으로 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은 결코 특별대우가 아니다. 인간 그 자체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다.
왜 법률로 명시해야 하느냐 누가 묻는다면, 법률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싶다. 예를 들어보자.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에게 바닥에 있는 제설제 10kg 포대를 들어서 옮겨야 하는, 앉았다 일어나야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사람은 없다. 굳이 지체장애인이 장애에 대해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설제를 옮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인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비난받을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행위는 상상되지도 않는다.
반면 비음성 비수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떤가. 누군가 청각장애인에게 입 모양 대로 얘기해 주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되면 요구대로 말하지 않은 사람은 정당하고, 청각장애인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 오히려 비음성 비수어 청각장애인은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요구나 도움만 요청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다.
최소한,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소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지체(휠체어)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휠체어 경사로처럼 비음성·비수어 청각장애인에게도 입 모양과 문자를 통한 대체 소통방식이 법적으로 명시 되고 마침내, 그것이 권리로 인정받아 비음성. 비수어 청각장애인도 당당히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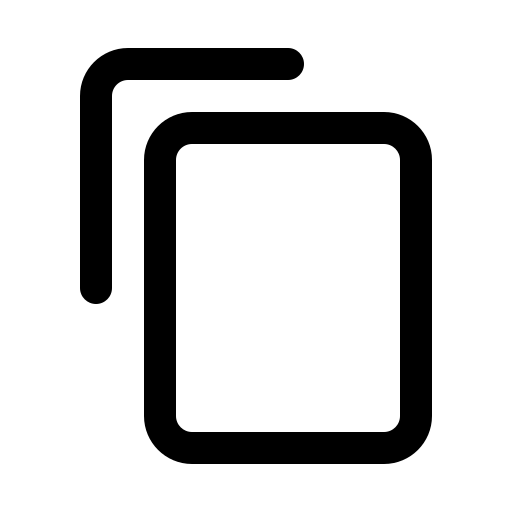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