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제안일자2025.06.26
조회수13
실용(實用)의 그림자와 바람직한 실용 정책을 위한 제안
Ⅰ. 실용의 이름으로 무시되는 것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실용’ 을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각종 정책에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 외교, 실용 정책, 실용 협상, 심지어 ‘실용 정부’ 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실용은 마치 시대 정신처럼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실용이란 이름 아래 무엇이 간과하고 있는 지를 성찰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용이 비실용으로 귀결되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모든 가치를 ‘유용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철학적 입장을 기반으로 한다. 그 자체로 현실 감각을 중시하는 합리적 태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과 중심의 실용주의가 도덕적 가치와 과정의 정당성을 무시할 때 발생한다.
예컨대, ‘이익을 얼마 냈느냐.’가 유일한 성과의 기준이 되고, ‘정성을 다했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문장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칫 ‘무능’으로 단정되고,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거나, 힘으로 문제를 밀어붙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결과에 집착하는 실용주의는 종종 섣부른 조치와 과장된 기대, 그리고 무책임한 책임 전가를 낳는다.
Ⅱ. 실용이 윤리를 배제할 때의 위험성
실용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가장 심각하게 배제되는 것은 도덕성과 윤리성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하는 윤리적 대원칙은 무시되고, 유용하기만 하면 어떤 수단이든 용인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이 같은 인식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운영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실용은 ‘보편 가치’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경제적 이익, 국제 협상력, 행정 효율성 등 단기 성과만 중시하다 보면, 정의, 포용, 공공성 같은 근본적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 규범을 허물고, 국민들의 정서적 피로감과 정치적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Ⅲ. 바람직한 실용 정책을 위한 제언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이 진정한 실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1. ‘도덕적 실용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실용성을 추구하되, 그것이 공공선과 윤리적 가치 위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용성이 곧 정당성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며,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2. 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투명한 실용’을 지향해야 한다. 빠른 결정과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는 정보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시민의 동의와 신뢰다.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동의를 생략하는 방식은 결국 실용의 실패로 이어진다.
3. ‘단기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실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당장의 성과보다, 정책이 사회 전체의 회복력과 미래 세대의 삶에 기여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실용은 오늘의 이익보다 내일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때 진짜 실용이 된다.
4. ‘상대방의 유익’을 실용의 성과로 인정하는 외교 감각이 필요하다. 협상에서 얻는 이익은 항상 ‘제로섬’이 아니다. 상대국이나 타 집단에 유익을 주더라도 관계 개선, 신뢰 구축, 상호 존중의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것 또한 실용의 성과로 간주해야 한다.
Ⅳ. 마치며
- 실용은 윤리와 함께 걸어야 한다 -
실용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지만, 도덕 없는 실용, 윤리 없는 유용성, 과정 없는 성과주의는 국가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진정한 실용은 가치와 현실, 목적과 수단, 윤리와 효율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용이 그러한 균형 위에 설 수 있을 때, 국민은 실용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실용이 아니라, ‘도덕성과 공공성을 내장한 품격 있는 실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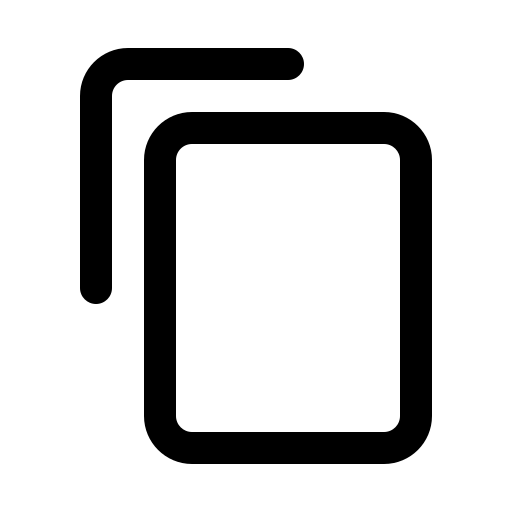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