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감정치유 AI, 공존을 위한 정서 인프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성자김창석
제안일자2025.07.27
조회수6
1. 취지
우리 사회는 정보의 과잉보다 감정의 과부하가 더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확증편향, 감정 과잉소비 구조는
개인을 ‘상시 분노’ 상태에 머물게 하며,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운영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1)극단주의 확산 2)세대·성별·계층 간 혐오 3)고립과 무력감 증가로 이어지며, 더 이상 기존 교육·복지·노동 정책만으로는 이 감정적 단절을 치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AI 기술을 정서 회복 도구로 전환하여
‘감정의 인프라’를 사회 기반시설처럼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술이 인간을 닮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통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핵심 제안
감정치유 AI를 공공기반 사회기술로 개발 및 보급
주요 기능 및 서비스 방향
1)감정 상태 인식 및 피드백: 부정적 감정 과잉 상태 감지 후, 감정 조절 훈련 콘텐츠 제공
2)확증편향 알림 시스템: 편향적 정보 소비 시 경고 메시지 및 균형정보 제안
3)감정 리셋 훈련: ‘느린 감정일기’, ‘비교 중단 콘텐츠’, ‘자기 객관화 연습’ 등 포함
4)관계 회복 시뮬레이션: 갈등 상황을 가상 대화로 연습하고 회복 가능성 높이기
개발 및 운영 방향
1)공공 감정기술 연구소 설립 및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2)청년층, 고립계층 대상 시범사업부터 추진
3)학교·복지·심리지원기관과 연계된 감정치유 AI 실증 사업
4)감정 회복력 지수(RER) 개발 및 정책 연동 활용
3. 기대효과
1)사회통합: 감정적 혐오, 극단주의 정서의 선제적 진단 및 완화
2)청년정책: 자기객관화 능력 향상, SNS로 인한 감정 왜곡 차단
3)민주주의 회복: 갈등의 정치에서 공감 기반 민주주의로 복원
4)기술 윤리: AI의 감정 모사기능을 ‘사회적 회복 기술’로 전환
4. 정책 제안의 차별성
기존의 심리상담·복지 시스템이 ‘수요자 선별’에 집중되었다면,
본 제안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감정 인프라 구축을 지향합니다.
감정치유 AI는 단순히 ‘위로’하는 기술이 아닌
감정을 견디고, 돌아보고, 회복하는 능력을 함께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고립, 관계 포기, 민주주의 혐오가 확산되는 현 시점에
정서 기반 회복 시스템 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결론
기술은 어느새 감정을 흉내 낼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서로를 ‘견디는 법’을 잊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정 또한 인프라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치유 AI는 공공기술입니다.
무너지는 감정 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되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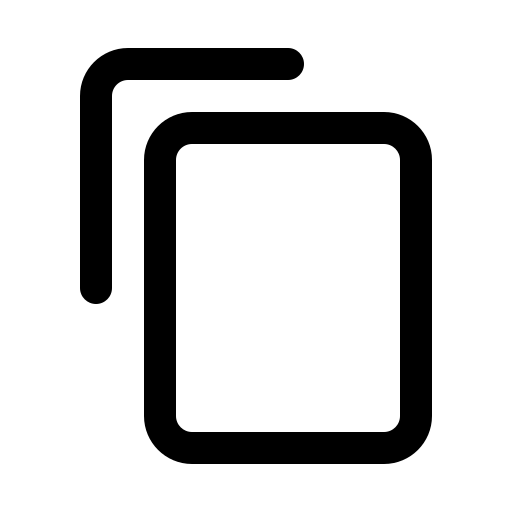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