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검찰개혁: 무리한 수사(경찰) 및 기소(검찰)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안
작성자박정준
제안일자2025.07.26
조회수11
🔍 사건 요약: 이재용 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 핵심 사실
사건명: 이재용 외 13인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수사 시작: 2018년 참여연대 고발 → 2019~2020년 대대적 수사
검찰 수사: 관련자 300여 명 조사, 50여 곳 압수수색, 디지털 자료 2,270만 건 분석
기소 시점: 2020년 9월,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무시
재판 결과:
1심 (2023.2): 23개 공소사실 전부 무죄
2심 (2025.2):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법 (2025.7.17): 상고 기각, 최종 무죄 확정
⚖️ 주요 쟁점과 비판 포인트
1. 검찰의 과잉 수사 및 ‘먼지 털기식’ 접근
전방위 압수수색, 800회 이상 조사 등 수사 강도는 이례적.
그룹 전체를 겨냥한 범위로 인해 재계 및 법조계 일각에서 “위축 효과” 비판.
2.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무시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검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권고 불이행. 기소 강행.
“심의위는 권고일 뿐”이라는 명분으로 무력화 → 제도 신뢰도 훼손.
3.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
1심·2심 모두 전부 무죄였음에도 검찰은 대법까지 상고.
“검찰의 자존심 수호 목적”, “무리한 법리 확대 해석”이라는 비판.
💬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1심 무죄 시 검찰의 항소가 법적으로 불가.
→ 한국은 가능하나, ‘기계적’ 상소의 폐해 방지 필요.
🧠 사법 및 제도적 분석
✅ (1) 검찰권 통제 필요성
무죄 확정에도 책임 없음: 기소·상소로 피고인이 수년간 재판받고 무죄가 나와도, 검찰은 책임 없음.
✏️ 제안:
상소 실패 시 책임성 강화 (국가 배상 의무화 등)
수사심의위 권고의 ‘강제력’ 부여 검토
✅ (2) 기업 관련 특수수사의 구조적 재검토
과거: 일부 유죄 확보 → “정치적 명분 확보”
현재: 글로벌 기업 대상 ‘정밀 타격’ 수사 요구 증가
“삼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하는 기업인데, 검찰은 과거 방식 그대로” – 특수통 내부 반성도 존재
🔄 파장 및 사회적 논의
🏛️ 법조계 반응
“수사·기소·상고 모두 무리… 검찰이 책임져야”
“권한은 많은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무하다”
재판부는 명확히 “검찰 주장 대부분이 추측과 시나리오에 기반했다”고 판단.
🏢 재계 반응
“사법 리스크 족쇄 풀렸지만, 이미 잃은 10년”
“이런 일 다시 반복돼선 안 돼”
✍️ 결론 및 제언
❗ 이 사건은 단순한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 권한의 남용,
제도의 무력화,
공권력의 비정밀한 행사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제도 개선 방향
검찰의 상소권 제한 또는 조건부화 – 예: 1·2심 전부 무죄 시 상고 제한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강제력 부여
검사 상소 실패 시 ‘국가 배상 책임’ 명문화
정밀 수사 및 기소기준 내부 지침 강화
공소유지 실패 시 내부 징계 제도 도입
🧩 참고로, 이 사건은 다음과도 연결됩니다:
2016년 국정농단 → 삼성 뇌물죄 → 경영권 승계 수사로 확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한동훈 전 장관이 3차장검사
이후 정치적 의미까지 겹쳐지며 ‘검찰권 정치화’ 비판도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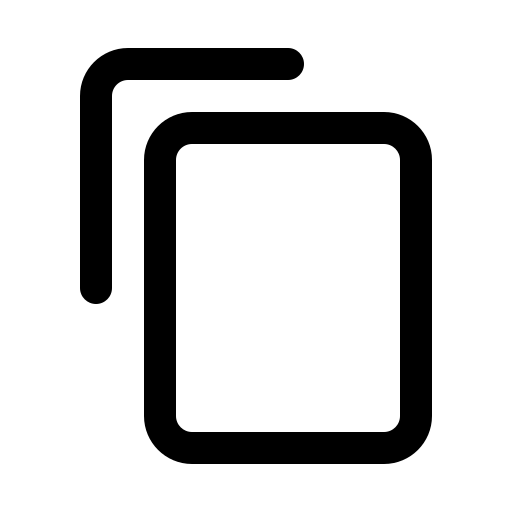
댓글 -
정렬기준
0/300